2016년 기준 전체 200만 범죄자 중 단 8천여 명…약물·재활로 관리 가능토록 편견 없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강력 범죄가 한 달 사이 3건 가량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성급한 편견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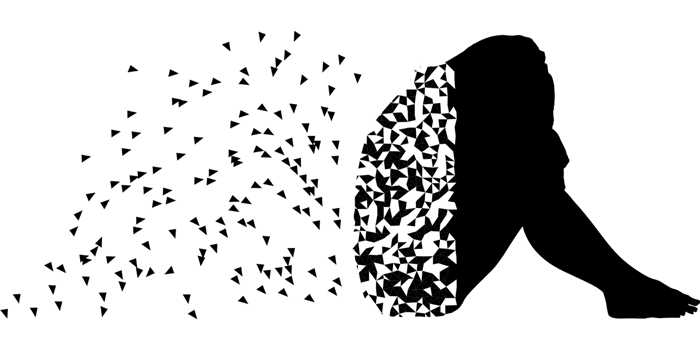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뿐더러 무작정 정신질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면 약물과 재활 등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던 조현병 환자는 제때 치료 받지 않으면 폭력성을 띠게 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유 없는 분노감을 갖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반면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일반인의 범죄율에 비하면 높지 않다는 통계가 있다.
대검찰청에서 집계해 발간하는 ‘범죄분석 자료’ 2017년 판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범죄자 수는 약 200만 명, 이 중 정신질환자는 8300여 명으로 약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범죄분석 보고서에서도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의 범죄율은 1.2%로 집계됐으며 이는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아울러 조현병은 매우 흔한 질병으로 국내 약 50만 명이 환자이거나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편견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약물과 재활을 통해 관리가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주를 이룬다.
한 개원 정신과 전문의는 “조현병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복귀도 가능한데 이를 가로막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편견”이라며 “편견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외면하게 하면 치료 환경이 더욱 나빠진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조현병 등은 일반 범죄나 폭력 범죄와 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경우 폭력 위험성이 감소한다는 사실, 정신장애라는 것 자체는 폭력에 대한 다른 위험요인(폭력 전과나 약물중독 등)과 비교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등의 해외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범죄와 연관시키는 것은 명백한 오해이자 편견”이라며 “조현병을 개인이 가정에서 알아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도 바뀌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환자를 찾아가 상태를 체크하는 방문관리도 필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의료계와 관계기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은 악화 일변도를 걷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9일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앞서 5월에는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해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지기도 한 것.
이와 관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해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일반인보다 낮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연간 약 20만 건 이상의 강력 범죄 중 약 1천 건이 살인 및 살인미수인데 우리의 뇌리에는 조현병 환자가 행한 극소수 범죄만 기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회는 이어 “정상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며 “이 적은 위험성마저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조현병 환자들은 영원히 소외되고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